김천문화원이 전하는 마을이야기(31)
▶봉암서당과 정승바위가 있는 예지리
예지리는 신리와 인의리 사이에 놓인 예지1리와 봉계천 너머의 면사무소가 있는 송정일부, 그리고 극락산을 사이로 떨어져있는 율리, 입석의 예지2리로 구성되어있다.
예지리는 조선시대에 김산군 봉계동 중리로 불리어왔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예지 1동과 2동으로 분동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지1리 마을 중앙에는 봉암서당(鳳巖書堂)이 있는데 1540년 중종35년에 연일정씨 문중에서 자제교육을 위해 건립한 유서깊은 서당이다.
.jpg)
△연일정씨 문중에서 건립한 봉암서당
이 서당은 당초 마을입구에 세우고 도장서원(道藏書堂)이라 했는데 100년 뒤에 각곡(角谷)이란 곳으로 잠시 옮겼다가 1757년 영조32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기고 봉암서당으로 고쳤다고 전해진다.
많이 쇠락하기는 하였으나 서당과 연못이 보존되고 있어 학동으로 넘쳐났을 옛 정취가 느껴지는 듯하다.
봉계천을 사이로 서로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면사무소가 소재한 송정 일부도 예지1리로 속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나면서 마을 앞의 드넓은 지성걸과 장사례의 농지 상당부분이 편입되고 나뉘어졌다.
이같은 특이한 지명은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고 예지리로 낙향한 연일인 정이교(鄭以僑) 선생이 지세가 왕성하고 큰 들이라 하여 지성걸(地成傑)이라 하고 또 직지천을 따라 길게 모래사장이 형성된곳을 개간하여 들판을 만들었다하여 장사례(長沙禮)로 이름지었다고 전해진다.
송정을 지나 고속도로변의 지방도를 따라 한참을 가다보면 우측으로 율리와 외입석, 내입석의 세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예지2리가 나온다.
이 마을은 원래 광주이씨(廣州李氏)가 입향해 살면서 돌을 세웠다하여 이름을 입석(立石)이라 했다고 한다.
도로변의 율리는 원래 직지천변에 있던 마을인데 1936년 병자년수해 때 마을이 유실되자 밤나무숲이었던 현재의 자리로 옮기면서 밤율자를 써서 율리(栗里)라 했다고 주민 정선영(67세)씨가 전한다.
율리를 지나 극락산자락에 위치한 입석마을은 광주이씨가 마을을 개척하면서 정승바위를 경계로 안쪽마을을 내입석, 바깥쪽 마을을 외입석이라 했다는데 지금도 양 마을 입구에 1미터 남짓한 돌이 세워져있어 마을지명의 유래와 깊은 전통을 읽을 수 있다.특히 내입석 마을은 정승바위의 전설로 유명하다.
.jpg)
△내입석 마을앞 정승바위 전경 도로확장공사로 본디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 전설은 조선 성종 때 판서와 우의정, 영의정을 차례로 역임한 이극배(李克培) 선생이 주인공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숙부인 김씨가 벼슬살이로 객지에 나가 있는 남편과 떨어져 내입석에 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무쳐 스님에게 시주를 하며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방도를 물었다는 것.
이에 스님이 마당에 있는 연못에 소금 석 섬을 뿌리고 마을입구에 튀어나온 바위를 깨트리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고 그러자 연못에 살던 학이 산너머 봉계로 날아가고 사흘 후 남편이 사망했는데 좁았던 마을 입구의 바위를 깨트린 탓에 상여(喪輿)가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이 마을에는 벼슬길이 끊어졌고 학이 날아간 봉계는 번창해져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고 마을 주민이자 광주이씨 후손인 이용기(75세)씨가 전한다.
당시 숙부인이 살던 집이 2층집이었는데 그 집터가 농지로 변해 주민들은 지금도 이 일대를 이층들이라 부르고 있고 당시 숙부인이 소금을 뿌렸다는 연못의 일부도 웅덩이로 남아있다.
실제로 금릉승람(金陵勝覽)과 같은 우리고장의 향지에는 이극배 선생이 1455년부터 일정기간 내입석 마을에 살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정승바위 전설의 신빙성을 한결 더하고 있다.
.jpg)
△학이 날아갔다는 연못자리 집터가 변해 들판이 되었으나 이층이라는 지명과 연못의 일부는 남아있다.
<글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송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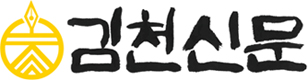



 홈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