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지난 6일, 자산동 충혼탑에서 거행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대해 잡변(雜辯)을 하고 싶다.
 |
현충(顯忠)은 충렬(忠烈)을 높이 드러낸다는 뜻으로, 즉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절의 영혼을 기리는 것이기에, 그 의식은 엄숙하게 거행된다. 이날 의식은 헌화, 분향, 헌다 순(順)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원론적 동아시아 세계관에서는 죽은 뒤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본다. 영혼에 대한 주자의 견해를 담은 주자어류(朱子語類) 제3권에 영혼은 육신이 없을 뿐 정신(에너지)이 살아 있다. 영혼이 사람과 함께 있기에 음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제사(祭祀)라 하는 것이다.
제(祭)를 파자(破字)해보면, 육(肉) 달월(月), 또 우(又), 보일 시(示)로 되어 있다. 농경문화는 고기반찬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망자도 고기반찬을 좋아해서 그것을 내려다본다는 의미이다. 육식 중심의 제사는 육제(肉祭), 채소 중심의 제사는 소제(素祭)라 한다. 고기와 술을 올리는 제사에 비해, 차례(茶禮)는 과일과 차(茶)를 올린다. 차례(茶禮)는 불교 영향의 의식이다.
운동은 중단한다고 바로 멈추지 않고 일정 순간 이어지다가 멈추는 관성의 법칙처럼, 질료와 공간감을 차지하는 영혼도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에너지가 흩어진다. 이를 ‘기론’이라고 한다. 예전에 제사는 4대 봉사가 원칙이었다.
분향(焚香)은 동아시아의 전통이 아닌 외래문화의 영향이다. 이집트에서 신에게 향을 올리는 문화가 불교를 통해 유입되어, 묵호자(墨胡者/먹물색 옷을 입은 외래인)가 신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기록이 있다.
브로콜리너마저(Broccoli you too)의 노래에 “떠나가는 사람의 하얀 옷자락을 잡으면 흩어질 것 같은 그 끝을 바라보고만 있었네. (중략) 네가 준비한 밥이 따뜻해 나는 연기처럼 마셔버렸네”라는 가사가 있다. 영혼이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은 냄새를 맡는다. 이를 ‘흠향(歆香)’이라고 한다. 흠(歆)은 ‘영혼은 향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불교 팔부중 건달바의 향식에서 유래한다.
영혼을 기리는 의식은 모두 망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헌화방식도 꽃봉오리를 ‘고인(故人)쪽이다, 아니다 반대편이다’라며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존에 놓인 헌화 방향에 두는 것이 좋다. 영혼이 머무는 곳은 사당, 제사 지내는 공간을 제실, 사당이 없는 집은 위패를 둔다. 위패 모양은 기와집 형태를 취하는 연유이기도 하다. 위패도 남쪽을 향하게 두는 것이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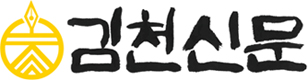



 홈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