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전)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교장 김영호
 |
|
| ⓒ 김천신문 |
고등학교를 다닐 때 신문을 구독했다. 당시는 야당지로 유명했던 동아일보였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면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는 것보다 신문을 보는 게 더 우선이었다. 당시의 신문은 한글 반 한자 반이었다. 예를 들면 1978년 9월 22일 월요일 1면의 헤드라인은 ‘共和 公薦 기초 調査 매듭’즉 ‘공화 공천 기초 조사 매듭’이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쓴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 신문을 다 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르는 한자도 제법 많이 나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옥편에서 한자를 찾아서 다시 읽곤 했다. 그러다 보니 신문을 보고 나서 복습과 예습을 하기로 했던 것이 내일로 늦어지거나 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호가 제일 먼저 구독한 신문은 고등학교 때의 동아일보였다. 그 뒤에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신문 등을 구독했었다. 아포로 이사를 하기 전에는 1년 동안 조선일보를 구독하기도 했다. 지금은 종이신문을 구독하지는 않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각종 신문의 뉴스를 검색하곤 한다. 종이신문의 추억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신문을 펴면 특유의 인쇄 잉크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게 묘한 기분을 들게 한 때도 있었다. 일찍 배달된 신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면 축축한 신문지를 아랫목에 한 장씩 펴고 말려서 본 기억도 있다. 어제의 신문을 흔히 구문이라고 한다. 이 구문은 급할 때는 화장실에서도 필수품이 되곤 했다. 우리 집에서는 지금도 참기름병을 포장하거나 각종 나물을 포장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대구신문 어린이 기자단 12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교에는 자랑거리, 학생회 활동 등 많은 기사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기사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둘째, 학교의 사소한 일이라도 자주 기사를 작성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셋째, 작성한 기사는 친구나 선생님과 의논해서 다듬는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말과 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말과 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자 얼굴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지도자(리더)는 자신의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신문은 자신의 글을 쓰는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충실히 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고 계발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대구신문 어린이 기자단 12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으로 대구와 경북의 초등학교의 좋은 소식이 널리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목요일에 대구신문의 어린이 기자 출범식을 축하하는 글이다. 당시 대구신문의 여인호 국장님의 소개로 신문에 글을 싣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대구신문에 ‘선생님의 글’을 연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회 이상을 연재하고 있는데 여인호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최장 기간 연재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화 통화나 만날 때마다 “김영호 교장 선생님은 글을 쓰시고 싶을 때까지 쓰세요. 단, 그만 두실 때는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과 관련되는 글감을 찾아서 매월 글을 쓰고 있다. 3월에는 입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졸업을 할 무렵에는 졸업과 관련되는 추억을 소환하고 있다. 김천신문에는 2024년 1월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수필공원에 연재를 하고 있다. 주로 우리 고장 김천의 이야기, 화양연화 농장이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 등이 오고가고를 반복하는 중이다.
신문 이야기를 하면 늘 떠오르는 학생이 있다. 1999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6년 동안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6학년을 3년 연속으로 담임했었는데 김준일(가명)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굉장히 똑똑하고 수학이나 영어 등 몇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 공부시간에 흥미가 적고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강온 양면 작전을 펴보았지만 쉽게 좋아지질 않아서 극단의 조치를 했다. 준일이의 동의를 얻어서 준일이의 책상을 연구실이나 교실에서 멀찍이 떨어진 복도 끝에 두고 두 종류의 신문을 주었다. 사설이나 칼럼 또는 중요한 기사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것을 공책에 요약하게 했다. 교실과 복도의 구분이 없어서 영호의 눈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없었고 준엽이도 그 공부에 썩 만족했었다.
그리고 교장으로 근무한 대구교동초등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보도 자료 작성은 영호의 몫이었다. 기안문이나 관련 교육활동 내용을 꼼꼼하게 참고하고 사진도 직접 찍었다.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나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그리고 두 학교에서는 대구신문 어린이 기자의 업무도 영호가 담당했다. 해당 학년에서 학생을 추천해주면 교장실에 모여서 기사 작성의 방법에 대한 공부를 했다. 어린이 기자들이 영호의 이메일로 기사를 보내오면 간단한 윤문 정도만 하고 해당 신문사로 발송했다. 어린이 기자들과는 영호가 작성하는 학교의 보도 자료와 겹치지 않게 사전 조율도 했다. 어린이 기자들에게 신문을 보거나 기사를 작성할 때 “신문을 심문하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 제목은 왜 이렇게 붙였을까? 사진은 왜 이 사진일까? 행간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 이 내용은 정말 사실일까? 등등이다. 사실 영호는 책이나 신문을 보면서 자신에게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게 습관이 되었다. 신문(新聞)을 심문(審問)하면 세상이 보인다는 게 과장일까?
지난 3월 21일 금요일에 김천신문 창간 3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김천신문은 김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인터넷 미디어와 더불어 매주 종이신문도 발간하고 있다. 2025년 3월 20일에는 종이신문 제1678호를 발간했다. 김천신문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1억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중소 도시에서 30년 이상의 역사와 주간으로 종이신문을 발간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김천신문의 발전을 위해 애쓴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김천신문이 불의에는 추상같은 회초리가 되고 선의에는 따뜻한 아랫목 같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 김천의 양심으로 더욱 더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영호는 오늘도 김천신문을 심문한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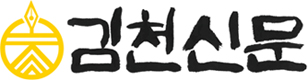



 홈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