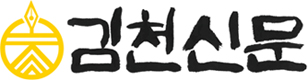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칼럼
홈
오피니언
칼럼
시론 ㅡ 6·25전쟁과 국가안보를 잊지 말자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19.07.01 17:19
수정 2019.07.01 17:19
박국천
(본지 객원기자협의회장)
박국천
(본지 객원기자협의회장)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을 맞이한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있기까지 3년 1개월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인명피해와 산업시설, 재산, 주택 등이 파손되고 수많은 이산가족을 남긴 채 휴전으로 포성이 멈춘 상태다.
휴전직후 국군전사자와 실종자(민간인 제외) 수는 16만2천374명 중 신원이 밝혀진 2만9천300명만이 현충원에 안장되고 아직도 유골을 찾지 못해 전투를 치렀던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 고향의 유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해가 13만 여구에 이른다.
호국보훈의 달 6월도 며칠남지 않은 지금 조국의 산야는 녹음이 짙어져 산새들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운다. 그 시절 풍전등화와 같던 조국의 운명 앞에 목숨을 바쳐 적과 싸우다 산화한 영영들의 영혼 앞에 묵념과 감사를 드린다.
휴전을 한지 66년의 흘렀지만 북한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비롯한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여 왔고 최근에는 남북협력협정, 북미핵폐기협상 등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중이지만 결과는 예측불허상태다.
북한은 여전히 남조선 혁명을 국가 제1의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주체사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사항이다.
북한과의 경제적 편차도 많은 우위에 있지만 세계 10대 교역국에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도 세계경제의 불황과 미중무역전쟁의 여파로 적지 않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위기관리’의 능력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아직 우리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설사 6·25전쟁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안보적 공감의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사항은 휴전 후 66년이 지나는 동안 6·25전쟁 미 체험 인구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시점에서 지금의 세대들은 비극의 한국전쟁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정도로 생각하는 의식이 있다. 이는 국가가 체계적인 교육으로 6·25를 인식시키며 안보의식을 새롭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결국 6·25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분단극복의 실마리를 풀고 굴절된 민족사를 바로잡는 단초가 될 것이다.
우리 국가의 제목이 될 청소년들이 6·25를 바로보고 인식할 때 평화통일을 이루는 이해를 가질 것이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10년 내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우리는 통일이 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통일을 맞아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6·25전쟁으로 인한 민간 인적피해 450만명(한국 200만, 북한 250만) 군인전사자 22만7천748명, 미군 3만3천629명, 기타 UN군 3천194명 중국군 90만명, 북한군 약 54만명으로 추산되는 이 전쟁을 잊지 말며 산화해간 호국 영영들의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지 객원기자협의회장)
 |
| ⓒ 김천신문 |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있기까지 3년 1개월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인명피해와 산업시설, 재산, 주택 등이 파손되고 수많은 이산가족을 남긴 채 휴전으로 포성이 멈춘 상태다.
휴전직후 국군전사자와 실종자(민간인 제외) 수는 16만2천374명 중 신원이 밝혀진 2만9천300명만이 현충원에 안장되고 아직도 유골을 찾지 못해 전투를 치렀던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 고향의 유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해가 13만 여구에 이른다.
호국보훈의 달 6월도 며칠남지 않은 지금 조국의 산야는 녹음이 짙어져 산새들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운다. 그 시절 풍전등화와 같던 조국의 운명 앞에 목숨을 바쳐 적과 싸우다 산화한 영영들의 영혼 앞에 묵념과 감사를 드린다.
휴전을 한지 66년의 흘렀지만 북한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비롯한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여 왔고 최근에는 남북협력협정, 북미핵폐기협상 등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중이지만 결과는 예측불허상태다.
북한은 여전히 남조선 혁명을 국가 제1의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주체사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사항이다.
북한과의 경제적 편차도 많은 우위에 있지만 세계 10대 교역국에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도 세계경제의 불황과 미중무역전쟁의 여파로 적지 않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위기관리’의 능력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아직 우리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설사 6·25전쟁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안보적 공감의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사항은 휴전 후 66년이 지나는 동안 6·25전쟁 미 체험 인구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시점에서 지금의 세대들은 비극의 한국전쟁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정도로 생각하는 의식이 있다. 이는 국가가 체계적인 교육으로 6·25를 인식시키며 안보의식을 새롭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결국 6·25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분단극복의 실마리를 풀고 굴절된 민족사를 바로잡는 단초가 될 것이다.
우리 국가의 제목이 될 청소년들이 6·25를 바로보고 인식할 때 평화통일을 이루는 이해를 가질 것이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10년 내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우리는 통일이 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통일을 맞아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6·25전쟁으로 인한 민간 인적피해 450만명(한국 200만, 북한 250만) 군인전사자 22만7천748명, 미군 3만3천629명, 기타 UN군 3천194명 중국군 90만명, 북한군 약 54만명으로 추산되는 이 전쟁을 잊지 말며 산화해간 호국 영영들의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