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김영호(전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교장)
 |
|
| ⓒ 김천신문 |
뒤란의 가죽나무는 밑동의 둘레가 50센티미터가 넘는 오래된 것이다. 감나무와 같은 시기에 심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가죽나무 잎이 조금 자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찬을 해 먹는다. 그때는 반찬거리도 귀한 시절이라 가죽나무 잎이 최대한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부모님은 햇볕이 좋은 날을 받아서 가죽나무 잎을 남김없이 땄다. 한 줄기 한 줄기 따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줄기가 함께 자란 밑동을 자른다. 자른 가죽은 샘물에 깨끗이 씻어서 말린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이 없던 시절이라 커다란 옹기 뚜껑에 밀가루와 고추장을 물과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든다. 이때 농도 조절이 중요하다. 반죽을 마칠 무렵이면 씻어 놓은 가죽의 물기가 다 마른다. 말린 가죽나무 잎을 반죽에 묻혀서 빨랫줄에 건다. 10여 미터가 넘는 빨랫줄에 길이 30센티미터가 넘는 가죽나무 잎이 열병하듯이 차렷 자세를 한다. 반죽이 너무 묽으면 빨랫줄 아래는 반죽이 떨어져서 빨간 줄이 생기기도 한다. 봄볕을 받으면서 꾸덕꾸덕하게 말라갈 때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떼어먹었던 것이 반백 년이 넘었다.
영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가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었다. 당시에는 벼농사를 짓던 지금의 화양연화 농장에서 흙벽돌을 만들고, 정골의 밭 가장자리에서 자란 버드나무를 김천의 제재소에서 서까래로 만들었다. 지붕은 당시 한창 유행하던 슬레이트를 얹었다. 새집을 지으면서 대문 입구의 감나무와 뒤란의 가죽나무를 베었다. 감나무는 땔감이 귀한 시절이라 풍성한 땔감을 제공해 주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자, 가죽나무는 두 자루의 빨랫방망이로 거듭났다. 그렇게 장만한 가죽나무 빨랫방망이는 하나는 우리 집에서 다른 하나는 작은집에서 오랫동안 빨래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게 해 주었다. 새집을 지으면서 대문도 지금의 위치로 바꾸었다. 감나무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백 년도 더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못내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
처가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앞마당에는 느티나무, 무궁화, 장미 등이 있었고 뒤란에는 대여섯 그루의 살구나무가 있었다. 제방 너머가 낙동강이라 땅이 비옥해서 나무가 잘 자랐다. 어느 날엔가 장모님이 느티나무 밑동을 싹둑 잘랐다. 아내는 그 일을 두고 장모님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 전에 주변 정리를 했다고 말하곤 했다. 굵고 단단한 느티나무를 그냥 두기에 아까웠다. 30센티 길이로 두 개를 잘라서 고향 집에 가져다 두었다. 마당에서 작업을 하거나 점심을 먹을 때 의자로 사용하고 있다. 명절이나 제사 때 가마솥에 어물을 찌고 돼지고기를 삶고 탕국을 끓일 때 의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 뒤에 처가가 있던 곳에는 2층 집이 몇 개 들어서서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느티나무 의자 두 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고향 집에서 김가네의 늙어가는 다섯 남매의 고단한 다리를 잠시라도 쉬게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것이다.
지금의 고향 집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 고향 마을의 다른 집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래서 농장에 나무를 심었다. 자두나무나 복숭아나무는 소득을 목적으로 심은 것이고 화양연화 농장의 입구에는 자귀나무를 심었다. 자귀나무는 추석을 앞둔 2021년 9월 12일 일요일에 심었다. 동생과 함께 20여 기의 산소 벌초를 하다가 산소 가장자리에 자생한 연필 굵기의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자귀나무를 발견했다. 벌초가 바빴으면 예초기로 베었을 것인데 마지막 벌초라 여유가 있어서 예초기를 끄고 산삼을 캐듯이 자귀나무를 캤다. 뿌리도 약하고 옮겨심어서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신줏단지 모시듯 자귀나무를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양연화 농장의 입구에다 옮겨심었다. 첫 해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보온에도 신경을 썼다. 퇴비와 물도 때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주었다.
자귀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2023년에는 영호의 키만큼 자랐고 가지도 사방팔방으로 펼쳤다. 좀 더 건강한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지는 한 뼘 정도만 남기고 모두 잘랐다. 2024년에는 더 크고 굵게 자랐다. 자른 가지에서 너 많은 가지가 나왔다. 긴 가지는 5미터 남짓 자라서 시원한 그늘도 생겼다. 자귀나무가 한 방향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굵은 줄로 당겨서 고정을 하니 곧게 자랐다. 2024년 가을에도 가지를 자랐다. 2025년에는 밑동의 굵기가 35센티미터 이상이 되고 키는 3미터 정도가 되었다. 가지는 수십 개가 사방팔방으로 뻗었으면 사이사이에 연분홍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다. 화양연화 농장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입에 올리는 것이 자귀나무이다.
자귀나무는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며 꽃말은 환희, 가슴이 두근거림이다. 이런 까닭에 산과 들에서 자라는 자귀나무를 마당에 정원수로 많이 심었다고 한다. 지금은 아파트에서도 화분에 자귀나무를 키우기도 한다. 자귀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귀의 손잡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였기 때문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자귀나무는 경상도 산골의 방언으로 짜구(작두)나무라고 불렀고, 나무 잎사귀는 빗살무늬로 끝이 뾰족하다. 농촌에서 소 한 마리가 총각에게는 결혼 밑천이던 시절에 남자 아이들이 소 풀을 베어다 소를 살찌우게 하는 소먹이로 작두나무가 인기여서 소쌀나무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2022년 7월 25일에 제주도에서 장례 절차 중에 상여가 나가기 전날을 일컫는 일포에 장봉철 교감 선생님의 부친 문상을 하였다. 제주시에서 5·16도로라는 별칭을 가진 1131번 지방도를, 버스를 타고 서귀포시로 가는 길 양쪽의 곳곳에 자귀나무 꽃이 만발해 있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상여를 장식하는 화려한 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까지 본 자귀나무 최대 군락지였다. 언젠가부터 화양연화 농장을 오가면서 자귀나무부터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이른 아침이면 잎이 열리고 밤에는 잎이 닫히는 오묘함에 빠져들었다. 처음 자귀나무를 옮겨심을 때는 별 뜻이 없었다. 자귀나무의 유래를 알고부터는 화양연화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늘 화양연화이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미국의 아동 문학가인 셸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이 1964년에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다. 어느 곳에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다.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고 사과도 따 먹고 즐겁게 함께 놀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은 나무의 사과를 가져가 팔아 돈을 얻었다. 가지를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지었다. 나무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된 소년은 이제는 노인이 되어 돌아온 밑동밖에 없는 그루터기에 앉았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고향 집의 감나무와 가죽나무, 처가의 느티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화양연화의 농장의 자귀나무와 영호도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무야, 나무야.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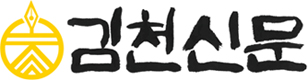



 홈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