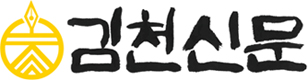more
 홈
특집
기획시리즈
홈
특집
기획시리즈
우리 고장 어제와 오늘<18> 양금동(陽金洞)편
권숙월 기자
입력 2015.10.07 17:32
수정 2015.10.07 05:32
조선시대 많은 과거급제자 배출한 인재의 요람
옛 김천장의 명성 잇는 황금시장으로 활력
 |
| ↑↑ 김천유기전 |
| ⓒ 김천신문 |
양금동은 고성산의 동남쪽을 둘러싸고 형성된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좌동, 우동, 약수동과 상리, 중리, 하리, 양곡으로 대표되는 하로마을로 나눠져 있었다.
1914년 좌동, 우동, 약수동이 황금정(黃金町)으로 통합됐다가 1948년 황금동으로 바뀌었다. 상리, 중리, 하리, 양곡동, 노천은 1914년 양천동으로 통합됐다.
하로는 김산(金山) 5대 반촌의 하나. 예로부터 화순최씨, 벽진이씨, 성산이씨 문중에서 많은 과거 급제자와 고관대작을 배출하며 이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 약수동으로도 불리는 약물내기에는 유기공방이 번성해 김천을 전국적인 방짜유기의 산지로 명성을 얻게 했고 이 지방 최대의 전설인 사모바위·할미바위 전설을 품고 있는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1998년 황금동과 통합된 양천동은 조선시대 말까지 양곡(상리), 중리, 하리, 노천(갈대), 장승배기, 안정개 등 크게 여섯 마을로 이뤄져 김산군 고가대면에 속했다. 1914년 고가대면이 감천면으로 개칭될 때 양곡(陽谷)의 양(陽)자와 노천(蘆川)의 천(川)자를 따서 양천동(陽川洞)이라 했고 1983년 금릉군 감천면에서 김천시 양천동으로 이속됐다.
□마을과 전설
김천지방 5대 반촌 하로
| ↑↑ 하로마을 |
| ⓒ 김천신문 |
상리, 중리, 하리를 통칭해서 하로마을로 불리는데 벽진이씨, 화순최씨, 성산이씨 등 삼성(三姓)이 집성을 이뤄 살면서 조선 초 많은 과거급제자를 배출한 김천의 대표적인 반촌이다.
하로라는 지명은 자손들이 수시로 과거에 급제해 고관에 올라 늙은 부모가 수시로 축하를 받았다는 뜻으로 축하할하(賀)자에 늙을로(老)자를 써서 하로(賀老)라 한데서 유래됐다.
이 마을이 김천지방 최대의 반촌이라는 사실은 마을입구에 있는 사모바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원래 모암산 바위절벽에 있다가 조선 중엽 현재의 위치인 하로마을 입구로 옮겨진 사모바위에는 이전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진다.
우리고장의 역사를 기록한 향지 ‘금릉지(金陵誌)’에 의하면 김천에서 많은 과거급제자가 배출되는 것은 이 바위의 정기와 관련이 있다는 당시의 분위기를 적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하고 요직에 등용된 이 고장 출신 인재들의 고향 방문이 잦아지면서 영접을 책임진 김천역의 역리(역 직원)들에게는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한 역리의 꿈에 도인이 나타나 사모바위를 깨트리면 바위의 영험함이 사라져 김천에 인재가 끊어진다는 것. 김천 방문이 줄어들어 역리들의 수고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마침내 바위를 깨트려 떨어뜨리니 이 지방에 과거급제자가 나오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하로마을 사람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하로마을 각 문중에서 옛 영화를 되찾고자 사모바위를 수레에 실어 현재의 마을입구에 뒀다는 것이다.
 |
| ↑↑ 사모바위와 할미바위 혼인례 |
| ⓒ 김천신문 |
1718년 여이명(呂以鳴) 선생이 쓴 ‘금릉지(金陵誌)’에 등장하는 사모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룡산 끝에 떨어진 돌이 있는데 그 모양이 사모와 같다. 전하기를 과거에는 용의 머리에 있어 하로의 최씨, 이씨 가문에서 벼슬을 많이 해서 수레의 왕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역리들이 그 폐단을 견디지 못하고 바위를 몰래 떨어뜨린 것이라 한다. 뛰어난 인걸이 땅의 기운을 받는다고는 하나 벼슬에 오르는 것이 어찌 돌에서 연유되겠는가. 돌이 떨어진 후 하리에 과거급제자가 배출되지 않고 침체되자 어떤 이는 그 돌을 원래 자리에 두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세상에 과아씨(娥氏 중국고사에 나오는 신화 속의 인물로 옥황상제의 명으로 산을 옮겼다는 장사)가 없는 것을 어찌하랴.”
이 전설이 출현한 시점은 연산군 시절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천으로 장가들어 살다가 관직을 마친 후 낙향해 김천에서 서당을 열어 후학을 양성한 점필재 김종직(金宗直)과 인연을 맺었던 김천의 인재들이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겪으며 대거 참화를 당한 사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모바위 전설은 김천역의 역리로 상징되는 중앙의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바위로 상징되는 김천의 인재들이 철저하게 탄압받게 된 당시의 정치상황과 지역민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하로마을은 벽진이씨, 화순최씨, 성산이씨 세 문중에서 많은 과거급제자와 고관대작을 배출해 이름이 났는데 특히 성종 때는 3판서와 6좌랑이 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세조 때 병조판서에 오른 이호성(李好誠)과 문종 때 공조판서를 지낸 최선문(崔善門), 성종 때 지중추부사를 지내며 청백리에 오른 이약동(李約東) 등이 있다.
또 달리 사모바위는 혼인형(婚姻形) 지세로 알려진 용두동, 황금동 일대의 풍수지리와 연계하는 시각도 있다.
즉, 조선시대 김천장이 번성한 것은 사모바위로 형상화된 모암산의 신랑과 할미바위로 형상화된 황금동의 신부가 마주보며 혼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신랑 신부 중간의 초례상에 해당되는 지점에 김천장이 위치하고 있어 혼례식장에 하객이 몰려드는 것과 같이 시장에 사람이 몰려 번성하게 됐다는 것이 전설의 요지이다.
특히 양금동은 조선후기의 실학자로 김천역장을 지낸 이중환(李重煥)이 자신의 저서 ‘택리지(擇里志)’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김산 서쪽이 곧 추풍령이고 추풍령 서쪽이 황간 땅이다. 황악산과 덕유산 동쪽물이 합해져 감천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이른다. 감천을 낀 고을이 지례, 김산, 개령이며 선산과 함께 감천물을 관개하는 이로움을 누린다. 밭이 기름져 백성들이 안락하게 살며 죄를 두려워하고 간사함을 멀리하는 까닭으로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가 많다. 김산은 판서 최선문의 고향이며 금오산이 있는 선산은 길재의 고향이다. 최선문은 노산군을 위해 절의를 지켰고 길재는 고려를 위해 절의를 지켰다.”
하로마을에서는 2009년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모바위 전설을 기록한 병풍형태의 석조물을 설치하고 할미바위 모형을 사모바위 앞에 모셔와 혼례식을 올려줬다.
마을입구에는 이 마을 출신으로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청빈한 관리로 꼽은 평정공(平靖公) 노촌(老村) 이약동(李約東)의 신도비가 있다.
이약동은 벽진이씨로 제주목사, 전라도관찰사, 호조참판 등 40여 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부임지에서마다 선정을 베풀었고 청빈한 삶으로 일관해 청백리의 대명사가 됐다.
또 화순최씨 가문의 문혜공(文惠公) 동대(東臺) 최선문(崔善門)은 문종 때 공조판서를 지냈는데 훗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하로마을로 낙향해 세조의 부름을 끝까지 거절한 절의충신으로 공을 따르던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은 “송죽 같은 지조요 물과 달 같은 정신을 지닌 참 선비”라는 찬시(讚詩)를 바쳤다.
개바위 전설이 전하는 양곡
 |
| ↑↑ 개바위 |
| ⓒ 김천신문 |
중리(中里)와 음지(陰地)마을을 지나면 성산이씨 집성촌인 양천6동 상리(上里)마을이 있는데 양지바른 마을이라고 양곡(陽谷)으로도 불린다. 옛날에는 상리와 음지마을 중간에 개가 누워있는 형상의 바위가 있어 엎드릴와(臥)자에 개견(犬)자를 써서 와견촌(臥犬村), 와개촌으로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폐동이 되고 개 형상의 바위만이 마을입구를 지키고 있다.
상리마을 뒤로는 고성산자락인 매봉(鷹峰)이 솟아있는데 이 산은 매의 형상인지라 산 아래 닭이 앉은 터에 자리 잡은 한 집안에서 흉사가 자주 발생하자 못 견디고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와개촌은 조선 태종 때 병조판서와 이조판서, 촤천성을 지낸 곡산한씨 평절공 한옹(韓雍)이 말년에 낙향해 살던 곳으로 사후에 안정계 마을 뒷산으로 유택이 정해졌다.
이호성 장군의 안장지 새마을과 안정계
 |
| ↑↑ 폐동된 노천마을 주민들이 이주해 형성한 마을 |
| ⓒ 김천신문 |
양천1동으로 속하는 국도 3호선 도로변의 새마을은 1930년대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원래 조마면 방면의 감천변에 노천리(蘆川里)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으나 1936년 병자년 수해 때 마을이 유실돼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고 새마을이라 했다.
양천1동으로 속하는 또 다른 마을인 안정계는 병조판서를 지낸 정무공(靖武公) 이호성(李好誠)의 묘소가 있는 마을이다.
중리에서 새마을로 넘어가는 하로고개에는 옛날 이 고개 정상부근에 샘이 있었는데 이 샘에서 물이 많이 나면 하로마을의 한 집안에 과부가 많이 생기고 물이 나지 않으면 또 다른 집안이 번성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다. 이렇게 되자 두 집안에서 샘을 파고 메우기를 반복하다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 결국 샘을 메워버렸다고 한다.
옛 역로를 지킨 마을 새터와 장승배기
 |
| ↑↑ 할미바위 |
| ⓒ 김천신문 |
양천2동은 양금폭포로부터 옛 양천동사무소 일대까지로 통상 신기, 새터로 불리며 국도에서 하로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따로 개울내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금동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의 양금폭포 아래에는 할미바위로 불리는 구부정한 바위가 있는데 사모바위와 함께 김천을 대표하는 할미바위·사모바위 전설에 신부로 나오는 주인공이다.
할미바위는 아들을 점지해주는 삼신바위로 이름이 났는데 구부정한 이 바위 아래 등을 붙이고 위로 돌을 던져 얹히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양금폭포가 세워지면서 지금은 폭포아래에 잠긴 형국이 돼버렸다.
이 바위와 모암산의 사모바위가 마주보며 혼인을 하는 혼인형(婚姻形)인 까닭으로 그 사이의 초례상에 해당하는 김천장이 잔칫집에 하객이 붐비듯 크게 번성하게 됐다는 전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조마방면의 안정계마을로부터 거창방면 국도와 연결되는 삼거리는 장승배기로 불렸는데 이곳에 조선시대 말까지 주막과 장승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방짜유기촌으로 번성기를 누렸던 황금동
양금동으로 통합되기 전 황금동(黃金洞)은 좌동(左洞), 우동(右洞), 약물내기(藥水洞), 자라밭골, 방천둑, 빗지걸 등 여러 마을로 나눠져 있었다.
좌동과 우동은 지금의 황금동성당 일대에 있던 마을. 옛날 성당 앞으로 지나던 개울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던 마을을 좌동(左洞)이라 하고 우측 개운사 방향의 마을을 우동(右洞)이라 했다.
이 마을 인근 개울가에 큰 버드나무가 즐비했고 고성산으로부터 이어진 수풀이 무성해 밤이면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다고 한다. 마을 청년들이 밤에 개울가에 모여 개운사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담력 겨루기를 했다.
약물내기(藥水洞)는 마을 뒤 골짜기에서 쉼 없이 맑은 물이 흘려내려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밤낮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일대에는 일제시대까지 유기공장이 밀집해 김천방짜유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약물내기 일대에 유기산업이 발달한 배경에는 이웃하고 있는 김천역과 감천을 이용한 도로와 수로가 재료와 완제품을 수송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또 김천장이 전국적인 시장망을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판매망의 역할을 했다.
일제시대 이후 침체기에 접어든 유기산업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 용기에 밀려 사양길에 들었다가 수년 전부터 유기의 효용성이 알려지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으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됐다.
약수동과 좌동, 우동사이의 고성산자락은 자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자라봉이라 하고 그 골짜기를 자라밭골 또는 자라동이라 했다. 자라밭골은 김천지방의 천주교가 처음 뿌리를 내린 곳으로 왜관 가실성당 신부였던 김성학 알렉시오 신부가 이곳에 초가집을 구입해 김천지역 최초의 성당을 세웠다. 방천둑 마을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인 용두동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 1919년부터 1922년까지 감천둑을 축조한 후 제방을 따라 길게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이름을 방천둑이라 했다.
빗지걸은 황금시장 거창방면 국도변 일대를 일컫는 지명으로 비석과 비각이 몰려있음으로 해서 비석거리, 빗지걸로 불렸다.
□양금동의 문화유산
황금동성당
 |
| ↑↑ 황금동성당 |
| ⓒ 김천신문 |
황금동 속칭 자라밭골에 위치한 천주교 황금성당은 칠곡군 왜관읍 가실본당의 김성학 알렉시오 신부가 김천, 상주,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복음화를 위해 김천에 성당을 세워줄 것을 조선교구장 뮈텔 대주교에게 건의해 설립했다.
1896년 칠곡 왜관 가실본당 2대 신부로 부임한 김성학 알렉시오 주임신부가 경부선 철도가 부설로 인구가 급격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천지역에 새 성당 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선교구회에 요청해 1901년 4월 27일 황금동 자라밭골 초가집 1동을 구입해 본당으로 삼았다.
1901년 5월 27일 김성학 알렉시오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고 1907년 기와집을 새로 건축해 성당으로 사용했다. 2000년 5월 27일에 100주년 기념으로 최경환 사베리오 신부가 새 성전을 건립했다. 황금성당은 초기에 김천, 상주, 문경, 선산 등 경상도 서북부 지역인 낙동강 서안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천주교 포교에 큰 활동을 펼침으로서 김천지역 복음화의 산실역할을 했다.
황금동교회
 |
| ↑↑ 황금동교회 |
| ⓒ 김천신문 |
황금동 67번지에 위치한 황금동교회는 미국 북장로회에서 1899년 우리나라에 파견한 부해리 선교사가 경상북도 서북부 지역을 담당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1901년 아포읍 송천교회를 설립한 후 김천 시내 지역의 선교를 위해 1903년 김천 시내 지역 선교를 위해 전도사 2명을 황금동으로 파견해 황금동 183번지 박상순의 자택 사랑방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렸다. 1907년 집을 매입하고 가건물을 건립해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김천 개신교의 역사를 열었고 1922년 132㎡ 규모로 확장 신축했으나 1950년 6·25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1953년부터 재건 사업을 시작해 1957년 615㎡ 규모의 교회와 교육관을 세웠고 1988년 3월에 4층 2083㎡ 규모로 교회를 신축하였다.
또 1919년 김천지역 3·1운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황금동교회 소속의 집사 김충한과 신도 김수길, 장로 최용수, 직원 한명수 등 8명이 교회에 모여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다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리고 장로 석수일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개운사
| ↑↑ 개운사 |
| ⓒ 김천신문 |
고성산과 남산 사이에 자리한 개운사(開雲寺)는 1918년 춘담화상(春潭和尙)에 의해 창건된 이래 팔공산 동화사의 포교당으로 운영됐다. 1926년 교구개편으로 문경 김용사의 포교당으로 변경됐다가 문경이 직지사의 교구에 속하게 되면서 김천시내 포교당으로 운영되면서 직지사의 말사가 됐다. 개운사는 제8교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교당으로서 김천시내의 신도확장에 기여했다.
창건 당시에는 30평 규모의 목조 극락전과 요사 1동이 전부였다가 1945년 명부전을 신축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남양홍씨(南陽洪氏) 청정화(淸淨華)가 건물 2동 8간, 대지 63평을 헌납하고 신도 전시철(全時喆)이 밭 895평을 시주했다.
명부전에는 2003년 4월 17일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 440호로 지정된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목조시왕상 등 19구가 봉안돼 있다. 이들 유물은 1685년 조성된 이래 증산면 쌍계사 명부전에 봉안돼 있었는데 1943년 일본인들이 고미술품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김천역으로 옮겼다가 해방이 되면서 쌍계사로 반납하지 않고 방치돼 있던 것을 개운사에서 명부전을 신축해 봉안하게 된 것이다. 지장보살의 복장유물인 신묘장구대다라니경의 종이재질을 분석한 결과 조성연대가 밝혀졌고 1977년 4월12일 진신사리 1과가 발견돼 1996년 삼층석탑에 봉안했다.
하로서원
 |
| ↑↑ 하로서원 |
| ⓒ 김천신문 |
벽진이씨 집성촌인 하로마을에 있는 서원으로 노촌(老村) 이약동(李約東)을 배향하기 위해 1984년 청백사(淸白祠)를 건립하면서 하로서원(賀老書院)으로 개창했다.
하로서원은 사당인 청백사와 교육을 담당했던 노촌당,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로 이뤄져 있다. 노촌당은 서당기능과 함께 1949년 양천초등학교 개교 전 임시 초등학교로 이용되기도 했다.
□양금동의 자랑
약물내기 방짜유기
@IMG11@
방짜유기라 함은 놋쇠를 녹여 두드려 만든 생활용구를 말한다. 김천은 안성, 충주, 이리와 함께 유기생산지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두드려 만드는 방짜유기의 명산지로는 김천이 단연 으뜸이었다. 지금도 약수동 또는 약물내기로 불리는 양천동 거창방면 국도변으로는 조선시대로부터 일제시대 말까지 가내수공업형태의 유기공방이 밀집돼 김천의 명물로 자리 잡았었다.
김천의 유기는 놋쇠를 두들겨 펴서 만드는 방짜를 고집한다. 식기, 요강, 세숫대야, 담뱃대는 물론 징, 꽹과리와 같은 농악기도 생산했는데 그중에서도 방짜 징이 유명했다. 흔히들 경상도 징은 웅장하게 울면서 뒤끝이 황소울음처럼 치켜 올라가면서 여운 있게 멎는 것이 특징이고 충청도 징은 말처럼 소리가 뒤로 흐르고 전라도 징은 육중하면서도 땅으로 내려깔리는 것이 다르다. 강원도 징은 흥겹고 뒷소리가 출렁댄다고 하는데 김천징이 바로 황소울음 같은 여운이 길고 올라가는 듯한 경상도 징의 소리를 대표한다.
방짜유기는 조상의 얼과 지혜가 함께 녹아 만들어진 산물이다. 최근 유기의 효용성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유기로 만들어진 식기류들의 인기가 급상승 중에 있다. 그래서 혹자들은 방짜유기를 생명의 그릇이라고도 부른다. 유기에는 해충을 쫓아내는 신비한 효능이 있고 미네랄을 생성하며 멸균 효과도 탁월하다는 것이다.
유기장인 김일웅씨가 1986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김천징장으로 지정돼 명인의 반열에 올랐으나 작고하자 지금은 둘째 아들 김형준이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양금폭포
@IMG12@
양천동에 있는 인공 폭포로 김천시에서 2000년 3월 할미바위의 전설이 서린 거창 방면 국도 3호선 변에 쉼터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천연 암벽에 물을 끌어올려 인공폭포인 양금폭포를 조성했다.
높이 31m, 폭 24m, 길이 10m 규모로 고성산 끝자락 바위 절벽에 조성됐으며 하단 저수조에 할미바위가 솟아 있다. 주변의 자연 여건을 활용해 파고라, 벤치, 화장실 등 주민 휴식 시설물을 함께 설치했다.
⭍양금동의 장터
황금시장
@IMG13@
평화시장과 함께 김천을 대표하는 전통재례시장인 황금시장은 용두동과 감호동 일대 감천변에 번성했던 옛 김천장의 명성을 이어가는 시장이다. 1950년대부터 거창통로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형성돼있던 노점상을 정리해 전통시장과 근대시장의 장점을 혼합한 시장으로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재 200여 점포를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특히 고추와 마늘거래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체소시장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최근에는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수요청년마캣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1960년대까지 황금시장에는 우마차를 생산했던 삼화철공소가 있었는데 전국최고의 실력으로 김천을 대표하는 철공소로 명성을 날렸다.
김천우시장
@IMG16@
김천장이 전국5대시장의 반열에 오르면서 함께 명성을 누린 또 다른 시장이 바로 김천우시장이다.
일제강점기까지 수원우시장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번성했던 김천우시장은 당시 하루에 500마리가 거래될 정도였다.
전국에서 소가 몰려들자 도축업과 우피산업도 번성해 전국 최대 우피거상으로 유명했던 김기진은 조선피혁주식회사를 차려 부호가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말까지 우시장은 용두동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황금동 감천변 현 취수장 인근으로 옮겼고 1967년 신음동 현 조각공원자리로 이전했다가 1989년 지금의 자리인 양천동에 터를 잡았다.
예전에는 중계인으로 불리는 속칭 소장수들이 흥정을 붙이고 현금거래가 이뤄지면서 현장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거나 도둑이 활개를 쳐 소판돈을 통째로 날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돼 투명한 거래가 정착되기는 했으나 예전의 시끌벅적한 시골우시장 풍경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양금동의 맛집
38년의 손맛 이어온 천지식당
@IMG14@
황금동 23-6번지에 위치한 천지식당은 38년 전 이주원내과 옆 초원식육식당을 운영하던 장재현(67세)-정조일(62세) 부부가 8년 전 황금시장 안으로 자리를 옮겨 터를 잡은 수육·선지국밥 전문식당이다.
천지식당(전화 432-2388)의 주메뉴는 순대국, 선지국, 돼지국밥 등 뜨끈한 국밥종류와 모듬순대, 사태살, 족발 등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술안주, 그리고 행사 때면 빠지지 않는 돼지머리편육 등이다.
요즘같이 힘든 경제에 5천원 짜리 한 장만 들고 찾아도 푸짐하게 배불릴 수 있는 메뉴들로 가득하다. 거기다 푸짐한 시장인심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어 오래된 단골부터 시장 손님에 상인들까지 천지식당을 찾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고 일과로 지친 심신을 힐링하기도 하는 식당이다. 가격만 착한 것이 아니라 맛도 착하다.
국물종류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으로 술안주는 물론 해장에도 좋다는 손님들의 평이다.
30여년의 고깃집 운영 노하우로 삶아낸 수육은 여러 가지 약재를 이용해 잡내를 잡았다. 지례5개면, 아포, 감문, 추풍령 등 인근 각지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맛을 보증한다.
“오랫동안 식육식당을 운영한 노하우를 살려 좋은 고기만을 엄선해 적당한 높이의 불과 알맞은 시간으로 조리합니다. 그 맛을 잊지 않고 40여년 가까이 찾아주시는 단골손님들이 계셔서 식당운영에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돼지머리를 눌러 만든 편육은 불의 세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삶아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게 주인장의 맛의 비법이다. 천지식당의 편육은 말랑말랑하고 쫄깃한 식감이 남달라 각 기관의 행사나 개인모임, 나들이로 연일 단체주문이 밀린다.
서울서도 찾아오는 찬물도랑횟집
@IMG15@
양천동 1779-9번지에 위치한 찬물도랑횟집은 이긍열(65세)-김정임(59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조마 진입로의 찬물도랑횟집(전화 434-1878)의 주메뉴는 송어·향어회와 메기매운탕. 이곳에서 영업을 한 지는 15년에 불과하지만 뛰어난 음식 맛에 사장 부부의 후한 인심덕분에 많은 단골손님을 확보했다.
“대구, 대전은 물론 울산, 서울에서도 찾아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다보니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것 같아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곳 찬물도랑에서 사용하는 송어와 향어는 개령면에 소재한 양식장에서 가져온다. 인삼이며 숯, 당근이 들어간 사료를 먹인 송어, 향어여서 그런지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메기 역시 인근 황금동에서 가져와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들깻잎 등을 넣어 이곳 찬물도랑만의 비법으로 요리하기 때문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다시 찾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독소가 전혀 없고 몸에 좋은 보약으로 알려진 메기매운탕. 김천인의 입맛에 맞는 매운탕을 만들기 위해 낙동에서 금산까지 맛있다는 매운탕집을 거의 다 찾아다니며 먹어봤다. 그렇게 해서 직접 만들며 익힌 노하우가 오늘의 찬물도랑을 있게 한 것이다.
김정임씨는 남산동에서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천사람이지만 남편은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평택에서 생활하다 김천으로 내려왔기에 주변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
찬물도랑을 개업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지금도 봉사활동은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게 생활이 된 김정임씨는 가난이 무서워 자녀도 딸 하나로 만족해야 했지만 이웃사랑의 열정은 아름답기만 하다.
□양금동의 학교
김천중앙고등학교
양천동 1153번지에 위치한 김천중앙고등학교는 1953년 4월 1일 금릉중학교로 인가를 받아 1964년 5월 1일 금릉고등학교로 개교됐다. 1978년 3월 1일 김천중앙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돼 오늘에 이르렀으며 1980년 6월 20일 중학교와 완전 분리됐다. 1981년 12월 11일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1995년 7월 19일 이병춘 회장의 학교부지 희사로 현 위치에 신축, 이전됐다. 2010년 3월 1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김천중앙고등학교는 2015년 현재 제49회에 걸쳐 1만5천15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김천석천중학교
황금동 67번지에 위치한 김천석천중학교는 1946년 10월 10일 배영중학원으로 설립, 개교돼 1952년 7월 8일 시온중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1969년 12월 15일 교동 527번지로 학교 위치가 변경됐으며 1970년 2월 19일 한일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됐다. 1989년 3월 11일에 학교법인 석문학원으로 변경된데 이어 1989년 6월 12일 김천석천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돼 오늘에 이르렀다. 김천석천중학교는 2015년 현재 제64회에 걸쳐 1만1천769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양천초등학교
양천동 1220번지에 위치한 양천초등학교는 1946년 7월 6일 감천국민학교 양천분교장으로 설치돼 1948년 7월 30일 양천국민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그해 10월 1일 개교됐다. 1996년 3월 1일 양천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돼 오늘에 이르렀으며 2015년 현재 제65회에 걸쳐 2천341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